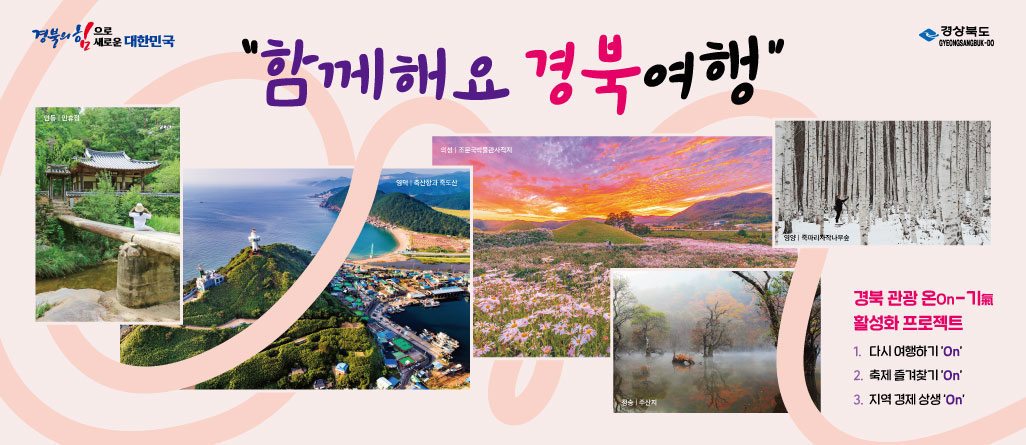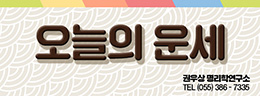칼럼
이런 것이 권력(權力)이다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극작가
“항상 선하려고 애쓰는 자는 선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 틈에서 반드시 파멸하게 되어 있다. 그러므로 권력을 지키고자 하는 군주는 선하지 않게 되는 법을 배워야 하며 그렇게 배운 바를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거나 이용하지 말아야 한다.” - <군주론> 니콜라 마키아벨리- (1469-1527)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세계 각국은 대통령이 될 만한 훌륭한 인물이 없어 보인다. 세계 최강국이란 미국도 예외가 아니다. 바이든처럼 나이가 많아 집에서 편히 쉴 나이에 대통령을 하는가 하면 한번 대통령을 지낸 트럼프처럼 크게 빛을 보지 못해도 거듭하는 경우를 보면 인물이 없는 것은 분명해 보인다. 문제는 훌륭한 사람은 정치를 하지 않을려고 한다는 점이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지난날 대통령에 출마했다가 중상 모략에 혼줄나 중도에 출마를 포기한 적이 있었다. 여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지만 정치는 상대와 싸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전쟁과 같다. 다만 전쟁은 ‘병법’에만 능통하면 승리할 수 있지만 정치는 ‘권력의 법칙’과 그 속성을 알아야 한다는 점이 다르다. 전세계 20개 언어로 번역 출판된 ‘전쟁의 기술’의 저자이며 ‘권력의 법칙’을 저술한 로버트 그린은 권력을 이렇게 말한다. “권력은 이 세상의 유일한 진실이다. 하루에도 수십번 파워 게임이 벌어지는 집단에도 권력은 존재한다. 사랑과 우정의 미움 뒤에도 권력 관계가 깔려 있다. 권력의 관점에서 바라볼 때에야 세상은 물론 진실을 드러내며 투명해진다. 즉 이 세상의 유일한 진실은 권력뿐이란 것이다.
도쿠가와 이에야스로부터 마오쩌둥, 케네디, 헨리 키신저까지 지난 3천년간 등장했던 수 많은 인물들의 성공과 실패를 보면 권력은 무서운 마약과 같다. 그러다 보니 쓰나미처럼 거친 기질이 아니면 정치를 하기 싫어하니 전 세계가 인물난에 허덕이는 것은 당연하다. 윤석렬 대통령 역시 인사를 보면 지난 정부에서 빛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마치 장기판처럼 여기 있던 사람을 저기에 갔다 놓고, 저기에 있던 사람을 여기에 갖다 놓는 모양새다. 전쟁에 패한 장군은 다시 전쟁에 내보는 경우는 세계전쟁사 어디에도 없다. 그래서 정치에서 한번 빛을 보지 못한 관료는 다시 쓰지 않는다.
‘정치는 다음 선거를 생각하지만, 정치가는 다음 세대를 생각한다.(Politicians think about the next election, but politicians think about the next generation.)’라는 말이 있다. 우리 나라에 인품이 올바르고 질 높은 정치가가 없는 것은 여당도 야당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나는 오래전부터 칼럼을 통해 국가 백년대계를 생각한다면 여,야 모두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즉 정당한 룰을 가지고 경쟁에 임할 수 있도록 동의한다면 국립 4년제 대학의 전문 정치가를 양성하는 한국 팔러티션 스쿨(Korean politician school : 한국 정치가 학교)를 설립하라고 한 것이다.
전 세계가 인물난을 겪고 있다 보니 이제까지 수천년 동안 대관식, 혁명, 쿠데타, 후임자 지명, 선거, 암살, 정권 교체 등이 셀 수 없이 많이 있었다. 왕, 수상, 대공, 대통령, 서기장, 절대 권력자들이 숱하게 권좌에 오르기도 하고 물러나기도 하였다. 강력한 통치자들 조차 예기치 않은 변화로 자리를 내주는 일이 있었다. 그러한 까닭에 유능하고도 지속적으로 지도력을 발휘하는 지도자는 찾아보기가 힘들었다. 훌륭한 지도자를 찾는 일과 관련하여 많은 사람이 희망을 잃은 것도 이상한 일이 아니다. 일부 나라에서는 사람들이 품고 있는 냉담과 절망의 감정이 특히 선거철이면 분명하게 나타난다.
한국 정치인중에는 근공원고(近功遠交)란 어휘도 모르는 사람이 있는 것 같다. 이 어위는 삼국지, 초한지에 나오는 말이다. 가까운 나라를 공격(멀리)하고 먼 나라와는 수교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한국 정치인 중에는 중국을 가까이 하고 미국을 멀리하는 자가 있다. 혹여 지정학적 때문이라고 한다면 지식의 깊이가 매우 낮다. 지구상에서 긴 국경을 맞대고 있는 미국과 캐나다는 국경 때문에 분쟁이 일어난 적은 없었다는 것은 원공근교(近功遠交)의 대표적인 사례다. 1795년~1918까지 강대국인 러시아, 독일, 오스트리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약소국은 멸망했거나 폴란드처럼 러시아 등 강대국의 눈치를 보며 살아야 했다. 그후 폴란드는 친미(親美)가 되어 미국의 안보 우산을 선택한 것이다.
원교근공이란 외교 전략의 대표적 사례다. 민주국가 한국과 독재국가 중국과는 물과 기름 같아서 절대로 화합될 수 없다. “정치는 사회 내의 제자리에 결합 조직을 재생시켜 놓을 능력이 없다. 정치는 전통적인 도덕 관념을 복원하기에는 너무나도 역부족이다. 아무리 훌륭한 정책으로도, 구혼이나 결혼에 대한 가치관을 회복하거나, 아버지에게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느끼게 하거나, 한때 존재했던 충격이나 수치심을 제자리에 되살려 놓을 수 없다. 우리를 괴롭히는 도덕 문제들 대부분은 법으로 근절될 수가 없다.” 미국 정부의 한 전직 보좌관이 한 말이다. 진(秦)나라 시황제에게는 장남 부소와 차남 호해가 있었다. 간신(奸臣) 이사는 “내가 죽으면 부소를 왕위에 승계하라”는 시황제의 유조(遺詔)를 호해와 음모하여 고친후 부소가 자결하도록 만들어 죽인 후 호해를 황제 자리에 앉히고 이사는 황제를 꼭두각시로 만들어 왕권을 잡았다. 그러나 2년후 진(秦)나라는 멸망했다. 이런 것이 권력이다.
현재 캐나다, 미국, 유럽 일부 지역, 뉴질랜드에서 사회 진보적인 젊은 신인들이 대거 정치계에 등장했지만 여전히 포퓰리스트들에 맞서 강력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인물이 없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히 필요한 것은 강력하고 포용력이며 도전적인 리더십이다. 그러나 정치의 극단적인 흐름을 감안하면 능력있고, 윤리적이며 실행력 있는 정치 지도자와 정치인은 거의 볼 수 없다.